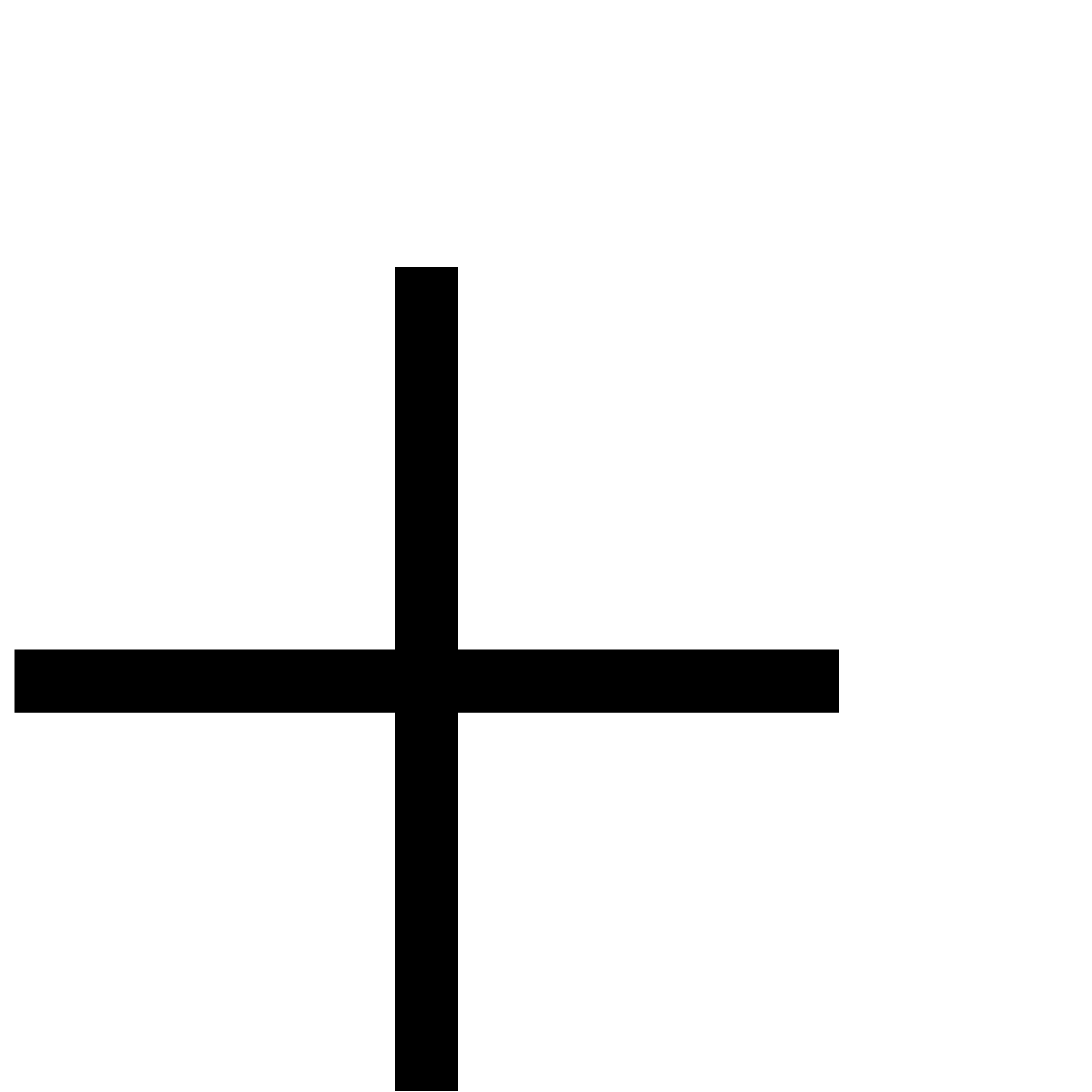문제 해결에서 문제 제기로,
인간 중심에서 탈 인간중심으로
빅터 파파넥의 ‘인간을 위한 디자인’을 읽고
목차
0. 서론
1. 디자인은 문제 해결이다?: 빅터 파파넥과 브루노 무나리, 그리고 인간중심 디자인
2. 디자인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제기다: 크리티컬 디자인에서 SF영화까지
3. 앞으로 우리-디자이너-가 가야할 길
0. 서론
‘“태초에 디자인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산업디자인은 아니다.’ [i] 빅터 파파넥은 산업 디자인을 설명하며 헨리 드레이퍼스의 ‘인간을 위해 디자인하기(Designing for People)’을 직접 인용한다. 그(헨리 드레이퍼스)는 디자인 결과물이 ‘타거나, 앉거나, 보거나, …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개인 혹은 대중에 의해 사용될 것이라는 생각을 견지해 왔’으며, 제품이 사용자에게 행복을 준다면 성공한 디자인이며, 불편함을 준다면 실패한 디자인이라고 말한다.[ii] 산업디자인은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이다. 우리는 이 개념이 탄생한 이후에 대량 생산과 빠른 소비, 그리고 무한 경쟁의 논리가 당연한 문화 속에서 자랐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제품이란 결국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논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면서 알지 못하는 사이 일어나는 일들이 미디어와 환경 운동가, 인권 운동가 등의 다양한 층위의 활동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오래되었다. 빅터 파파넥은 산업 디자인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본인이 디자이너임에도 디자인을 수없이 까내려가며 비판을 받기도, 이어서는 존경을 받기도 한 사상가이자 운동가이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논지와 근거, 방법론이 유효하다는 사실은 조금은 씁쓸하면서도 다시금 그의 생각을 되새기게 만든다. 본 글에서는 빅터 파파넥의 저서 ‘인간을 위한 디자인’을 중심으로, 그가 제시한 문제 해결로서의 디자인 방법론을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넘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 그의 사상가적 정신을 짚어 본 후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지에 대해 고민 거리를 떠안으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1. 디자인은 문제 해결이다?: 빅터 파파넥과 브루노 무나리
지금이야 ‘디자인이란 문제 해결이다’라는 문장이 흔하다 못해 지루하게까지 들리지만, 사실 이러한 주장을 주창한 디자이너들은 이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예시와 논리를 펼쳐야 했다. 빅터 파파넥은 디자인이란 ‘의미있는 질서를 만들어 내려는 의식적이고 직관적인 노력’[iii]이라 정의하고, 디자이너가 가져야 할 중요 능력으로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명확히 하고, 정의하고, 또한 해결해내는 능력들이다.’[iv] 라고 말한다. 그는 디자이너가 문제를 인식하고, 명확히 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각적, 감정적, 연상적, 문화적, 직업적, 지성적, 환경적 장애물을 해결해야 하며 그 사례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한다. 그리고 그 사례들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문화적 장애물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그는 연구에 따르면 변기들이 너무 높고,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미국의 ‘문화적 장벽’을 부숴야 한다고 설명한다.[v] 그런데, 놀랍게도 변기 문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였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는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많은 금액을 사회 공헌에 투자하는데, 그 일환으로 진행된 공모전 중 하나는 ‘변기를 재발명’하는 것이었다. 변기는 너무 많은 물을 사용하고, 구조적으로도 비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나 나라에서는 구비하기 어려운 인프라를 기반으로만 작동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공모를 통해 수많은 발명을 제안 받았으며[vi], 몇 가지를 사업화 하는데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빅터 파파넥이 언급한 변기의 높이 문제를 반영하여 쪼그려 앉아 볼일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디자인도 있었다.
한편, 디자인을 문제 해결로 정의한 사람은 빅터 파파넥이 유일하지는 않다. 브루노 무나리(1907 – 1998)는 이탈리아 출신 디자이너로서, 빅터 파파넥보다 앞선 세대 디자이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저서 ‘Da cosa nasce cosa(번역서 제목: 디자인이 디자인을 낳는다)’는 “일이 뜻밖에도 순조롭게 진척되는 것”이라는 뜻[vii]으로, 그가 책 전체를 통틀어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순조롭게 담은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책의 서두에서 마치 레시피처럼 디자인 방법론을 소개한다. 그는 디자인이란 문제를 정의하고(Definizione del Problema), 문제 요소를 분석하고(Componeti del problema), 정보를 수집하며(Raccolta dati), 그 정보를 분석한 후에(Analisi dati) 자연스럽게 창의성을 발휘하여(Creatività), 재료를 선정하고(Materiali Tecnologie), 평가해보며(Sperimentazione), 최종 모델을 만들고(Modello), 검증한 후에(Verifica), 설계도를 만들어(Desegni costruttivi) 해결(Soluzione del problema)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viii]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브루노 무나리와 빅터 파파넥이 창의성을 언급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브루노 무나리는 ‘직관적 아이디어는 예술적, 낭만적 문제 해결방법에 그친다’며, 창의력은 그것을 대신하여 ‘디자이너의 방법론에 따라 실행하게 된다’고 말한다.[ix] 즉, 그에게 창의력이란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며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표출’이다.
하지만 빅터 파파넥은 인간의 사고방식을 분석적, 판단적, 기계적, 창의적 사고방식으로 구분하면서, 마지막 창의적 사고 방식을 ‘천재적 영감의 불꽃’[x]이라고 표현한다.


︎︎︎브루노 무나리의 디자인 방법론에서의 창의력[xi]
︎︎︎빅터 파파넥이 인용하는 ‘하하-아하-아’곡선
︎︎︎빅터 파파넥이 인용하는 ‘하하-아하-아’곡선
이 방식은 놀랍게도, 개인적으로 지난 2019년 HCI학회 중 하나인 DIS에 논문 발표를 위해 갔을 때 다른 방식으로 경험한 바 있다. 해당 워크샵[xii]은Texas A&M 대학의 Tamu sketch recognition lab[xiii]에서 개설하였는데, 브레인스토밍을 패러프레이즈 한 ‘스케치 스토밍’ 방법이었다. 그런데 이는 이연현상과 비슷한 지점을 많이 갖고있었다. 시간을 3분 정도로 지정해 두고, 3-4명의 참가자가 빈 종이를 두고 아이디에이션을 시작한다. 3분이 지나면 스케치를 설명할 시간을 주지 않은 채 빈 종이는 다른 참가자에게 넘어가고, 서로의 스케치 위에 덧그리면서 아이디어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언어를 연결지어 혼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연현상은 독자적 실행성을 갖지만, 엉뚱한 아이디어와 ‘오해’된 정보를 통해 강제적으로 아이디어를 충돌시키고 창의성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빅터 파파넥과 브루노 무나리가 말한 문제 해결로서의 디자인, 그리고 창의력은 맥락과 뉘앙스, 구체적인 방법론은 다를지 몰라도 결국 디자인을 ‘총체적인 문제 해결의 사고 방식’으로 본다는 점에서 현대의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 인간 중심 디자인(Human-Centered-Design)등의 사조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다. IDEO에서 제창한 것으로 잘 알려진 인간 중심 디자인[xv] 또한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면서 출발하는데, 위의 두 방법론과 다른 점이라면 사용자 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다. 제작하는 디자이너의 문화적 맥락과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진사용자 집단의 이질성을 잘 이해하고자 하는 방법이었고, 인류학적 이론과 실무 지식을 많이 동원하여 구성되었다.
그렇다면, 디자인이 단순히 ‘사용자를 행복하게 한다’에서 출발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로 발전했다고 봤을 때, 더 이상 디자인의 역할은 확장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빅터 파파넥은 그 의문을 제기한 초기 사상가 중 한명이었다.
2. 디자인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제기다: 크리티컬 디자인에서 SF영화까지
빅터 파파넥은 당시로서는 터무니없게 여겨지는, 또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하나’싶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디자이너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자각해야만 한다’고 분명하게 주장하였으며[xvi], 이에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이 아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디자인’을 세상에 보였다. 그는 디자인이 사회적, 도덕적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지에 대한 풍자적 글을 개제했는데, <롤리타 프로젝트(The Lolita Project)>라는 이름으로 ‘퓨처리스트(The Futurist)’지의 1970년 4월호에 실렸다. 그는 그 글에서 여성을 완전히 성적 만족용 도구로 보는 사회에서 한 가상의 기업이 인조 여체를 커스터마이징 해 판매하는 것을 일종의 가짜 광고로 제안한 것이다. 놀라운 점은 이 글에 대해 적절한 풍자(sarcasm)로 본 독자보다 이 광고를 실현시키기 위한 투자자와 온갖 ‘기득권’세력의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그는 이 기사를 통해 ‘기업과 거기에 속한 디자이너들이 성차별적 남성적 편견에 비위를 맞추는 방식을 드러내’[xvii]고자 했으며, 뿐만 아니라 이를 기점으로 산업디자인과 성을 결합한 ‘디자인의 정치적 역할’을 실행하고자 했던 것이다.
빅터 파파넥이 미래를 내다보고 이를 비꼬며, 때로는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며 목소리를 높힌 것은 사상가이면서도 동시에 디자이너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위트와 비판적 시선은 이후 ‘크리티컬 디자인(Critical Design)’이라는 이름으로 계승된다. 크리티컬 디자인은 이 분야의 창시자로 불리기도 하는 Anthony Dunne과 Fiona Raby에 의해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처음 이 단어가 언급된 것은 Anthony Dunne의 저서 Hertzian Tales(1999)에서 였으며, 이는 빅터 파파넥뿐 아니라 1960년대, 70년대의 영국의 아방가르드 건축과 이탈리아를 기점으로 한 Radical Design 등의 사조를 이어받은 것이었다.[xviii] 이들은 Technological Dream Series 등의 대표작을 MoMA등에 선보이며 디자인을 단지 상품과 사용성, 시장성의 맥락이 아닌 작품으로서 제시했다.



그들의 시범적인, 그리고 실험적인 작품에 영감을 받아 많은 작가와 디자이너들이 이러한 비판적 맥락에서 디자인 작업을 해오고 있다. Superflux의 Uninvited Guests의 경우, 가상의 ‘스마트 지팡이’를 통해 미래에 노인들을 자녀들이 지팡이로 ‘감시’하고, 이에 지쳐버린 노인이 스마트 기능을 속이고 도망가버린다는 암울한 이야기를 그린다. 이 이야기의 핵심 매개체인 지팡이는 실제 존재하는 제품이 아니다. 단지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 상상속에 존재하는 디자인인 것이다. 이러한 실험적 시도는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더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산업사회 문명을 해체하고자 백지에서 토스터를 만드는 과정을 아카이빙한 Thomas Thwaites의 토스터 프로젝트, 그리고 그가 인간이 아닌 염소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을 아카이빙한 고트맨 프로젝트가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그 행위 자체가 하나의 매체가 되고 그 과정에 들어간 디자인적 요소와 결과물이 강력한 메신저가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세상이 어떤가에 대한 자각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작품에서도 이러한 사조는 찾아볼 수 있는데, 대만 학생들이 오염된 물을 얼려 만든Polluted Popsicles, 눈물을 얼려 쏠 수 있는 총을 만든 Design Academy Eindhoven 학생 Yi-Fei Chen의 작품을 들 수 있다. 각기 하고자 하는 말은 달라도, 그 디자인은 그 자체의 효용에서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 혹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세지를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크리티컬 디자인이라는 사조, 또는 문화적 맥락은 전시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당장 우리가 매일 보는 넷플릭스의 대표작인 ‘블랙미러’또한 미래를 상상하여 각종 사물과 도구들을 매개로 암울하거나 때로는 교훈적인 메세지를 전달한다. 블레이드 러너에 등장하는 ‘기억을 심는 도구’는 보기에는 아주 복잡하고 그럴듯 하게 생겼지만, 현실에서는 그저 영화에 개연성과 구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프로덕션 디자이너의 스케치이다. 디자인은 이제 문제 해결이라는, ‘정답을 향해 달려가는’ 방식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디자인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사람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사상적 도구이자 문화적 교육 매체로 역할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앞으로 우리-디자이너-가 가야할 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진전할 힘을 못 얻는 사변적이고 다소 의미주의적인 본인의 특성상, 디자인에 있어서도 ‘왜 해야하는가’가 ‘어떻게 해야하는가’가 앞섰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방법이 어떻게 되었던,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가장 큰 우선순위였고, 그랬기에 아트와 디자인 사이, 그리고 크리티컬 디자인과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사이를 오가며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작업을 해왔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왜 보다는 어떻게가 더 중요한 이슈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당장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지겨울 지경까지 이른 ‘친환경’이슈를 들어보면, 2009년에 발표된 디자인 다큐멘터리 Objectified에서 디자인 평론가 Alice Rawsthorn은 너무나 많은 제품들-디자인의 결과물-이 쓰레기장으로 빠르게 생을 다하고 들어가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미 충분히 가진 10퍼센트도 되지 않는 소비자라고 지적한다. 심지어 이렇게 만들어진 쓰레기는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며, 이는 디자인 업계가 끝없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커다란 아젠다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왜’ 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무리 명확하고 선명해도, ‘어떻게’가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애플의 스페셜 이벤트는 고무적이다. 100퍼센트 재사용 재료를 사용해 아이폰을 제작한다는 발표였다. 어떻게가 비로소 한 단계씩 실현되는 순간이다. 이 외에도 비행기를 타지 않고 현장감 있는 co-working 환경을 만들어내는 spatial 등의 AR기술 기업[xxiv] 의 행보를 보면, 우리가 기술과 디자인으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
작년 겨울, 아이슬란드와 모로코를 여행하며 빙하와 사막을 직접 본 경험을 했다. 아이슬란드의 빙하 위에 직접 올라가 본 적이 있다. 그리고 가이드는 저 멀리를 가리키며, 작년에는 저기까지 빙하였다고 말했다. 매번 뉴스에서 듣던 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온 몸이 떨리도록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내 발 아래의 빙하가 지금 녹고있다는 체감. 그 기분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다.


[i] Papanek, 현용순., 조재경., 현용순, & 조재경. (2009). 인간을 위한 디자인 / 빅터 파파넥 지음 ; 현용순, 조재경 [공]옮김, 57-58면
[ii] Ibid., 58면
[iii] Ibid., 27면
[iv] Ibid., 199면
[v] Ibid., 215면
[vi] https://www.gatesfoundation.org/what-we-do/global-growth-and-opportunity/water-sanitation-and-hygiene/reinvent-the-toilet-challenge-and-expo
[vii] Munari, & 양영완. (2010). 디자인이 디자인을 낳는다 / 브루노 무나리 지음 ; 양영완 옮김, 386면
[viii] Ibid., 63면
[ix] Ibid., 51면
[x] Papanek, 현용순., 조재경., 현용순, & 조재경. (2009). 인간을 위한 디자인 / 빅터 파파넥 지음 ; 현용순, 조재경 [공]옮김, 200면
[xi] Munari, & 양영완. (2010). 디자인이 디자인을 낳는다 / 브루노 무나리 지음 ; 양영완 옮김, 52면
[xii] https://dis2019.com/accepted-workshops/
[xiii] https://people.engr.tamu.edu/hammond/index.html
[xiv] Papanek, 현용순., 조재경., 현용순, & 조재경. (2009). 인간을 위한 디자인 / 빅터 파파넥 지음 ; 현용순, 조재경 [공]옮김, 230면
[xv] https://www.ideo.com/post/design-kit
[xvi] Papanek, 현용순., 조재경., 현용순, & 조재경. (2009). 인간을 위한 디자인 / 빅터 파파넥 지음 ; 현용순, 조재경 [공]옮김, 145면
[xvii] Ibid., 149면
[xviii] https://www.moma.org/collection/terms/136
[xix] http://dunneandraby.co.uk/content/projects/10/0
[xx] https://superflux.in/index.php/work/uninvited-guests/#
[xxi] https://www.thomasthwaites.com/the-toaster-project/ , https://www.thomasthwaites.com/a-holiday-from-being-human-goatman/
[xxii] https://edition.cnn.com/style/article/sewage-popsicles-taiwan/index.html
[xxiii] https://www.dezeen.com/2016/11/02/tear-gun-yi-fei-chen-design-academy-eindhoven-dutch-design-week-2016/
[xxiv] https://spatial.io
[xxv] https://vimeo.com/ondemand/objectified/
[xxvi] https://www.apple.com/kr/apple-events/october-2020/?useASL=true